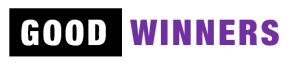예수님의 비유해설 4: 틈 메우기를 통해 비유를 해석하기
작성자 정보
- 섬김이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10 조회
- 1 댓글
- 0 추천
-
목록
본문
다. 틈 메우기를 하며 읽는다
독자의 읽는 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틈 메우기이다. 틈이란 글에 나타나는 모호한 부분들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논리의 비약, 본문이 설명하지 않은 사회 관습, 시공간의 불연속성 등이 틈이다. 독자는 본문을 읽어나가다가 모호한 부분이 나오면 독자 나름대로 그 부분을 해석하고 넘어간다. 이것을 틈 메우기라고 한다. 독자가 틈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본문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틈 메우기는 독자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막 13:28-31)에서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고 한다. 여기서 여름이 추수 때라고 생각하는 독자는 이것이 상징적으로 종말의 때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이 비유에 종말론적 색채가 강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여름은 곡식이 한참 자라는 때라고 생각하는 독자는 이 비유에서 상징적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무화과나무의 변화를 보고 시절을 알 듯이 종말의 징조를 보고 종말을 알라는 의미로 보게 된다. 이 경우 비유의 의미는 비슷하지만 느낌은 달라진다. 독자는 이런 틈을 자기의 지식으로 메우는데 그 지식에는 외부지식과 내부지식이 있다.
1) 외부지식
외부지식이란 독자가 현재 읽고 있는 책 이외에서 얻은 지식을 말한다. 독자는 책을 읽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읽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외부지식을 가지고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지식으로 지금 읽는 책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독자가 외부지식으로 틈을 메우지 못하면 글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한글로 쓰여진 대학교재를 중학생이 한글을 안다고 아무리 술술 읽을 수 있어도 전공용어들이 의미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마 18:21-35)를 읽을 때 달란트의 가치와 데나리온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왕이 종의 빚을 탕감해준 액수와 종이 동료 종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은 액수를 비교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독자는 비유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없게 된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를 읽을 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적대관계를 알지 못하면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 전해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사랑은 인간의 장벽과 적대관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
외부지식에는 사회관습에 대한 지식과 문학기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 사회관습에 대한 지식에는 종교적 관습, 사회-경제적 관습, 사회-문화적 관습, 역사적 사실과 지리적 특성에 대한 지식 등이 중요하다. 종교적 관습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예로는 레위인의 종교적 지위를 알아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보여주는 정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사회-경제적 관습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예로는 청지기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여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눅 16:1-8)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관습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잔치 때 주인이 예복을 준비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혼인잔치 비유(마 22:1-14)의 중요한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데서 잘 나타난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박해받은 것을 알아야 악한 농부의 비유(막 12:1-12)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단, 종교적 지식에 있어 우리는 저자적 독자가 구약성서나 복음서 이전에 기록된 유대문헌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지만 지금 읽고 있는 복음서 외의 다른 신약성서의 책들은 몰랐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런 책이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에 널리 알려졌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나 교훈은 저자적 독자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비유를 해석할 때 다른 복음서나 바울서신에 나온 모든 내용과 비교하며 해석하지는 않고 초대교회에 널리 퍼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만 참조하며 해석한다.
문학기법에 대한 지식으로는 문학양식(장르), 평행법, 교차대칭법, 인클루지오, 풍자법 등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비유를 읽을 때 단순히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한 모습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비유 양식인지 비유의 여러 가지 요소가 각각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알레고리 양식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해서는 율리허 이후 부정적인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는 부당하다. 만일 비유를 말한 사람이 알레고리로 말했다면 그것은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한다. 알레고리가 아닌 것을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알레고리이거나 알레고리적 성격이 있는 비유를 알레고리적 성격을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의 비교점만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밖에 평행법, 교차대칭법 등의 예는 『문학-역사비평이란 무엇인가?』를 참고하라.
2) 내부지식
내부지식이란 독자가 현재 읽고 있는 책에서 얻은 지식이다. 특히 신약성서의 저자적 독자는 글을 순서대로 읽어 가는 사람이므로 내부지식은 현재 읽고 있는 본문보다 앞부분에서 얻은 지식이다. 내부지식 중에 본문 해석에 중요한 것은 본문에 가까이 있는 것과 본문의 주제와 밀접한 내용을 가진 것이다.
예를 들면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마 18:21-35)를 읽을 때 다른 종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탕감받은 빚을 다시 갚으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저자적 독자는 이미 마태복음 6:12와 6:14-15에서 사람이 자기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읽어 알고 있다. 이런 내부지식이 독자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눅 12:16-21)에서 부자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다가 어리석은 자라는 꾸중을 듣는다. 누가복음의 저자적 독자는 여기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내부지식으로 알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읽게 된다.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재물의 허비가 심각한 잘못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또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재물의 바른 사용이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임을 알고 있으므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적용에서 이웃을 위해 재물을 쓰라는 교훈(눅 16:9)이 나올 때 잘 이해할 수 있다.
라. 예상과 회상을 통해 읽는다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앞으로 무슨 내용이 나올지 예상하면서 읽는다. 독자는 글을 읽어가면서 자기가 예상했던 것이 맞으면 자기가 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계속 읽어간다. 하지만 독자의 예상이 틀리면 독자는 지금까지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 된다. 이런 경우에 독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이해한 것을 수정하고 새로운 이해 속에 글을 읽어나가게 된다. 또한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 나온 본문의 내용을 보완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본문의 해석에 도움을 받는 것을 회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독자는 회상을 통해 앞에서 이해한 내용을 강화, 수정 혹은 보완하며 바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재물을 허비한 청지기가 징계를 받는데 그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복음 12:13-34에서도 알고 또한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적용부분(눅 16:9-13)에서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저자적 독자는 재물의 바른 사용이 이웃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읽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재물로 이웃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준다. 이 경우 저자적 독자는 12장과 16:1-13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맞는 것으로 알고 계속하여 누가복음을 읽어간다. 아울러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회상을 통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재물로 이웃을 도우라고 가르친 교훈을 더욱 강화시켜준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저자적 독자는 이웃을 물질로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제사장마저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다고 하여 악한 사람으로 정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눅 10:38-42)는 예수와 그 무리를 물질적으로 돕지 않고 예수 앞에 앉아 말씀을 들은 마리아를 더 높여준다. 이것은 물질로 이웃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을 받는 것도 그 이상으로 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회상을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관련자료
-
링크
-
첨부등록일 2024.05.11 00:02
사랑이님의 댓글
- 사랑이
- 작성일